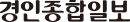공영방송 드라마 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종편 tvN의 ‘또 오해영’의 주인공 오해영(서현진 분)이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극중 이야기 전개가 한국방송에서 매년 수없이 사용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고 사랑에 목숨 거는 줄리엣의 이야기 구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에 목숨을 거는 여자 줄리엣의 이야기는 한국방송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이야기 구조다.
지난 수년간 한국 방송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여성들을 대체로 보면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사랑 보다 일에 집착하고 결국 그런 능력들이 잘나가고 있는 남자의 눈에 콩깍지를 만들어 자본주의적 신분상승을 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공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신데렐라에 대한 식상함이 만연해 있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태양의 후예’도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능력 있는 여성의 잘나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었다. 그러나 오해영은 한술 더 떠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는 여자다. 직장에서는 같은 이름의 잘 나가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고, 일을 혼자 하고서는 이름조차 상사나 동료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똑바로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 그대로 투영된 현실의 틀 안에 존재할 만한 여자의 사랑이야기다. 그래서 목마름이 비슷한 시청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해영은 겁이 많은 현대인이다. 자존심에 상처받기 싫어하고 남에게 충고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에게 결혼 전날 차이면서도 자기가 찼다고 하는 것을 허락받아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전형적인 속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오해영은 상당한 인기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비상한 능력이 있는 여자도 아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과 결혼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인 것처럼 허구를 쏟아내는 드라마 그리고 모든 재벌의 총수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신데렐라를 결국에 받아들이는 드라마에 식상한 시청자들은 오해영을 통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얻어가고 있다. “그래 나도 저럴 수 있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소연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욕도 하고 상처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공감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걸으면서 울기도 하는 오해영을 사랑스러운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