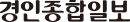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침을 가했던 세월호 의인 민간 잠수사 김관홍(43)씨가 지난 17일 별세했다. 사람을 구하러 간 사람들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했던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었던 그의 죽음에 무거운 애도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일부는 잊힌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못 밝히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분통이 터지고 욕지거리가 나오는 것을 참고 있으며,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한국의 국력으로 배가 뒤집혀 가는 동안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으며 정부각료들과 관계자들은 배가 침몰하고 있었던 이틀 동안 구조를 하지 않았다. 왜 구조 하지 않았는지 속 시원하게 이유를 밝혀주는 부서나 관계자가 없다. 배가 뒤집혀 있는 동안 모여든 수많은 배들과 한국이 자랑했던 구조함, 미군 헬기 구조대까지 모두 세월호 옆에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세월호 밖에서 “그대로 있어라”를 주문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이제는 미치도록 알고 싶다.
또 뒤늦게 그 배에 해군강정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 400여톤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것은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세월호와 관련된 비밀이 정말 국가 안보상 꼭 필요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비밀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물에 빠져 숨진 사람들이 손을 웅크리고 서로를 부둥켜 앉은 상태에서 이를 바라본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다. 차디찬 물속에서 그들의 엉킨 손을 하나하나 풀어 육지로 시신을 운반한 사람들의 고통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악몽처럼 끔찍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구조당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까지 물으려 했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또 남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세월호 선장에게 집중했다. 세월호에 정부 관계자가 요구한 물건이 실려 있는 것조차 인지 못한 비정규직 선장은 선장 명패만 빌려주었을 뿐 책임과 권리가 하나도 없었던 비정규직에 불과한 사람에게 배의 전복사고와 인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다 전가했다. 명패를 빌려주었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못한 세월호 선장은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배에 해군강정기지건설에 필요한 철근 말고 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영화라면 정말 잘 짜인 각본이다. 배에는 알 수 없는 물건이 있었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수학여행 나온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출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뒤집혔다. 미군을 포함한 구조대가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이틀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했던 사고발생 직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행불이었다. 이런 것들이 영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현실이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이자 딸들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침묵에서 벗어나 모든 사고의 경위와 관계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속속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주범이자 살인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 값은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