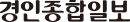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창룡문’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동문이다. 종각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문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문루 위루 해가 오르는 모습이 용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서 창룡문이라고 한다.
창룡문의 크기는 서울의 남대문과 같다. 문의 바깥쪽으로는 옹성이 있어 성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의 형태는 ‘홍예문’이다. 홍예문위에는 2층의 망루가 있다. 수원화성의 문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창룡문의 망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성의 안쪽으로는 넓은 잔디광장을 사이에 두고 연무대가 보인다. 연무대는 정조가 군사를 지휘하던 지휘소이다.
서울 같으면 사적에 직접 올라가보고 만져본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수원화성에서는 누구나 모든 건물에 직접 들어가 역사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을 보호하는 옹성과 옹성 위의 여장 하나하나를 다 만져볼 수 있으며 홍예문 위에 건축된 목조건물의 구조 하나하나를 모두 손으로 직접 만져볼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일 년 삼백육십오일 다 유효하다.
창룡문을 지나 서쪽으로 걸어가면 ‘봉돈’을 볼 수 있다. 봉화를 올리는 시설물인 봉돈은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조선의 여러 시설물 중에서 봉화는 통신체계에 속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통상 산성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원화성은 읍성임에도 봉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화성행궁을 소중하게 여겼던 정조의 마음일 것이다.
봉돈 또한 만져보고 봉화를 피워 올렸던 구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비교적 문화재 관리에 꼼꼼한 수원이 봉돈을 유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직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봉돈을 본다면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봉화시설과 실제의 차이점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200년 전부터 수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수원 교통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남문에 이르면 서울의 남대문과 같은 규모의 커다란 문이 사람들과 어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문을 중심으로 가고 싶은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팔달문’이라고 한다.
‘팔달문’을 지나 성벽을 따라 가면 팔달산에 오르게 된다. 성벽 중간 중간에는 각종 ‘치’와 ‘포루’를 만나볼 수 있다. 포루의 구멍사이로 보이는 수원의 정경과 일상은 때로 바쁘기도 하고 느긋해 보이기도 하지만 포루는 늘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포루의 구멍 모양과 크기는 모양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이것들만 따로 모아도 재미있는 모자이크가 된다.
팔달산 정상 부근에는 북서암문이 하나 있다. ‘북서암문’을 빠져 나가면 측성을 따라 양쪽 옆으로 긴 성벽이 이어지고 있다. 팔달산의 정산 능선을 따라 늘어선 측성은 병자호란 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성의 형태이다, 수원화성은 병자호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측성이 있다. 측성을 따라 걷는 즐거움은 덕수궁의 돌담길보다 조용하고 또 고요하다. 바람이라도 불어준다면 혼자 드라마를 찍어도 좋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리고 측성의 끝에 가면 ‘화양루’라는 누각이 있다. 서울 같으면 힘든 일이지만 수원에서는 신발을 벗고 정자에 올라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다. 조용한 매미소리와 함께 말이다.
수원화성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역사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면서 화성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적 3호인 수원화성의 품에서 쉴 수도 있다. 이정도면 한번쯤 아이들과 함께 수원화성으로 놀러올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2016년은 수원회성 방문의 해다. 짐을 싸고 지금 출발하면 수원회성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