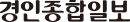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퇴근 시간도 조정하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하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만 모르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평균 삶의 질과 저녁조차 없는 서민과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료들의 탁상공론은 오히려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있다. 정말 무엇이 중한지조차 모르는 탁상공론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이에 인구절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는 브레이크조차 없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서 기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차별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외국인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더 나아가 상대적 빈곤에 대한 차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는 것이 현 정부의 출산율 팀이다.
과거 한국이 절대빈곤 국가이었을 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등장할 만큼 다산의 한국이었다. 절대 빈곤이 만연했음에도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덜 했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의 시대에는 소수 친일파와 권력자를 제외하고는 차별이 없었다. 모두가 가난하다는 전제는 상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빈곤이 해결되면서 한국의 차별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서민 아파트 단지와 떨어져 살기 원했고 잘사는 고급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다. 직장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었으며 또 비정규직은 파견직, 무기직 그리고 단순 노무와 아르바이트로 나뉘면서 차별이 정당화 됐다. 한국에서의 차별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다. 차별이 정상이라는 사회에서 그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애를 낳겠다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가 낳을 아이가 사회에서 차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 보편적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었다.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철학을 만들어 차별을 줄이자는 철학적 정치가 출산율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편적 민주주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집권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차별이라는 장벽은 높아만 갔다.
보편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무상급식조차 없애자는 정치집단이 집권한 사회에서 애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비정규직일 수 있으며 서민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정규 군대는 가야하는 비상식적 애국심만 요구되는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미래는 헬조선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 땅에서 태어나면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은 나라가 되면 애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애는 태어나기 마련이다. 절대빈곤은 협동을 부르지만 상대적 빈곤은 살인을 부른다는 기본방침조차 모르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적 빈곤으로 차별 받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