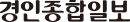동대문에서 창경궁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효제동에 완전한 어둠이 깔린 1923년 1월22일 새벽,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1000여명의 일본 경찰병력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모여들었다. 일본 경찰들은 벽을 뛰어넘고 달리며 순식간에 지붕을 넘나드는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좀처럼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었다. 쌍권총을 들고 겨울 새벽의 효제동을 휘젓고 다닌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 김상옥이다.
김상옥은 벌써 두 번째 서울 바닥에서 일본 경찰들과 단신으로 전투를 벌였다. 23일 새벽3시경에도 구리다경부를 비롯해 일본순사 10여 명을 살상했다.
일본 경찰이 김상옥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경찰의 본거지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면서부터다. 상해임시정부 의혈단 소속이었던 김상옥은 지난 1923년 1월 조선총독이 일본제국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동경행을 기회로 총독을 총살하려는 계획을 짰다. 임시정부에서는 안홍한(安弘翰)을 수행시켜 권총 4정과 실탄 수백발을, 그리고 대형 폭탄은 의열단에서 맡아 김한(金翰)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안동현(安東縣)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서울에 들어오도록 했다.
김상옥은 상해를 떠나면서 농부차림으로 변장하고 밤을 틈타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서 대담하게도 경비경관을 사살했다. 신의주에 들어와서는 세관검문소 보초를 권총으로 머리를 때려눕히는 등 격투를 벌이며 국내 잠입에 성공했다.
서울 잠입에 성공한 김상옥은 김한·서대순 등 동지들과 만나 조선총독을 총살하기 위한 치밀한 거사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상해 주재 일본경찰의 통보로 일제가 경계를 강화하자 조선총독 암살거사는 시일을 끌게 되었다.
조선총독이 암살이 늦추어지자 김상옥은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본경찰과 친일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폭탄투척 당시만 하더라도 의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일본경찰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김상옥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추격을 시작했다. 1월 17일 새벽 3시 은신처인 매부 고봉근(高奉根)의 집이 종로경찰서 수사주임 미와(三輪和三郎)에게 탐지됐다.
종로경찰서 우메다(梅田新太郎)·이마세(今瀨金太郎) 두 경부 지휘 아래 20여 명의 무장경찰에게 은신처가 포위됐다. 고봉근의 행랑방에 들어 있는 여자가 종로경찰서에 있는 친정오빠에게 밀고하여 탄로난 것이다.
은신처가 탄로나자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였다. 먼저 종로경찰서 유도사범이며 형사부장인 다무라(田村振七)를 사살했다. 이마세·우메다 경부 등 수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추격하는 일본경찰에게 사격을 가하면서 눈 덮인 남산을 거쳐 금호동에 있는 안장사(安藏寺)에 이르렀다. 김상옥은 안장사에서 승복을 빌려 입고 효제동으로 다시 잠입해 동상 치료를 하던 중 일본경찰과 다시 시가전을 벌였다.
그러나 단신의 한계는 극복되지 못했다. 총알은 다떨어졌으며 이미 몸에는 10여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김상옥은 일본 경찰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총에 남은 마지막 한발을 가슴에 쏘고 자결을 선택했다. “몽둥이와 칼 아래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한 포로가 되지는 않겠다”는 독립투사 김상옥의 일갈은 효제동의 새벽을 달구었다. 시린 배벽 일본경찰에 포위되어 마지막 총알 한발을 남겨놓고 그가 목 놓아 불렀던 것은 대한독립만세다. 그리고 8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여전히 이어져 흐르고 있음에도 역사는 그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상옥 열사가 불렀던 대한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뿌리라는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