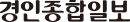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윤재천 수필 ㉗]
9시 뉴스는 시작하자마자 주차장으로 변한 고속도로가 보이기 시작한다.
빼곡히 들어선 차들이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차안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향을 향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표정이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매스컴에서는 민족 대이동의 현장을 보여준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고향을 찾아 유목민처럼 이동하는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풍속도이다.
이제는 명절에 맞춰 특별히 고향을 찾을 일이 없다. 출가한 딸과, 인사차 들르는 후배나 제자들을 집에 앉아 맞이한다. 하지만 TV화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불현듯 줄지어 늘어선 차들의 뒤꽁무니에 서서 고향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어진다.
고향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촉촉해지는 것은 나이 탓만은 아니다.
부모님은 유택(幽宅)에 계시고, 다른 형제나 친지들도 대부분 그곳을 떠나 옛집에는 향수를 느낄만한 것 하나 남아 있지 않지만, 고향이 말만 들어도 반가워지는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간다.
내 고향은 경기도 안성이다.
야트막한 산자락이 병풍처럼 처져있고, 물 좋고 비옥한 땅이 넓어 인심이 훈훈한 고장이다.
‘서운산’과 ‘칠현산’이 병풍처럼 감싸있어 그 안에 자배기처럼 동네가 들어앉은 아늑한 곳이다. 안성은 예로부터 안성맞춤 유기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배와 포도는 그 맛과 향미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내가 살던 집에서는 ‘비봉산’이 가까웠다. 비봉산은 산이라기보다 야트막한 언덕처럼 산책하기에 만만해서, 동네 사람들이 새벽이나 아침에도 가릴 것 없이 뒷짐 지고 오르기 알맞은 곳이다.
고등학교를 그곳에서 보내면서, 시간만 생기면 비봉산 정상에 올라 눈앞에 보이는 정겨운 마을을 굽어보곤 했다.
한달음에 정상에 올라서면 굽이굽이 내려다보이는 이름도 낯익은 동네, 골목의 훈기가 저녁 짓는 연기와 함께 풍겨와 그 산정에서 호흡을 고르다 보면, 기차가 멀리서 기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와 산, 산허리를 감도는 구름과, 그 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웃의 삶을 망연히 바라보며 즐기곤 했다.
산은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잎을 피우고 낙엽 지는 나무들을 곁에 두고 내려오는 길에서 인생을 생각하며 꿈을 키웠다. 산은 끝 간 데 없이 치솟기만 하던 젊음을 다스려 주어, 겸양과 순리를 깨닫게 해주는 무언의 스승이 됐다.
지금은 관악산이 가까운 곳에 살기에 주말이면 지인(知人)과 함께 관악산을 오른다. 30여 년 넘게 함께 하는 등산 친구들과의 모임도 알고 보면, 고향 뒷산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던 청년시절의 기억을 못 잊는 사람들의 향수 다스리기이다.
사람은 어려서 받은 인상이 오래도록 생각의 경계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내게 있어서 산은 고향이고 어머니이며 스승이다. 또한 가슴 밑바닥에 아련하게 간직되어 있는 사랑이다.
언제든지 야트막한 산을 보게 되면, 어릴 때 한달음에 뛰어올라 바라보던 산 아래의 정경과, 산기슭마다 어려 있는 기억들이 튀어나오곤 한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산을 좋아하게 되면 지혜롭다는 얘기는 책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고향의 산은 내게 오르막과 내리막, 열림과 닫힘, 인내와 환희로 다가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지혜를 주었다.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미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은 나이 탓만은 아니다. 가족 모두가 그곳을 떠나와 이제는 찾아가도 잠시 머무를 정이 생기는 곳도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귀소본능이 더해만 간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만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있다.
가까이 있으면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떨어져 있어야 그 가치가 돋보인다는 이치와도 같은 말이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객지 생활을 시작했으니 몸이 고향을 떠나온 것은 수십 성상이나, 아직도 고향집 앞돌의 대추나무와 대청마루에 내려앉은 햇살, 마당가에서 하얀 수건을 두르고 식구들을 위해 손을 움직이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어제인 듯, 눈에 선하다.
어머니, 고향과 어머니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맏이라서 그런지 어머니는 내게 항상 특별대우를 하셨다. 옷매무새가 단정해야 한다며 푸새질에 손 마를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음식을 장만할 때는 행여 티라도 들어갈세라, 머릿수건을 두르시곤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도 방학이 되어 귀향을 하면, 저만치 짐이 보일 때부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내가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으면 아침부터 일이 손에 안 잡혀 허둥대신다.
기다리는 눈치를 알기라도 하면 아들이 행여 마음을 쓸까 걱정이 되어, 눈과 귀만 대문 쪽으로 두고 대청마루를 닦고 또 닦으셨다.
저만치서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리면 뛰어나오기보다는 눈으로만 조용히 웃으시던 그 미소, 어머니의 미소는 객지살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약이 됐기에, 어리광 부리던 아이로 돌아가 따뜻한 품속으로 파고들고 싶다.
살아가면서 내게 여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게 하신 어머니, 조용한 가운데 기품을 잃지 않으며 가족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낙으로 알고 평생을 고아하게 사신 분이다. 생전에는 걱정만 끼쳐드리고 이미 고인이 된 후에야 가슴 저리게 그리워하는 것이 어머니이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그 멀고 먼 길,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를 마다않고 열 시간이 넘게 고행의 길을 가는 지도 모른다.
반겨 줄 고향과 어머니가 있는 한 그런 귀향은 계속될 것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잊고 살던 정겨움과 그리움을 흥건하게 적셔, 삶을 이어가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닐까.
올해도 나는 설날 아침에 귀향길에 나서지 못하고 가까운 관악산에 올랐다. 눈이 많이 내려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오면서 마음으로는 안성 고향 집 앞, 비봉산 자락을 더듬는다. 이 산길을 내려가면 어머니가 떡국을 끓여놓고 기다릴 것만 같아서다.
눈 쌓인 나무 둥치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손을 잡는 환상에 젖어본다.
생각만으로도 푸근해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운 고향이 되는 나이가 됐음을 깨닫는다.
…………………………………………………………………………………………………………………………
운정 윤 재 천
경기도 1932년 안성출생, 전 중앙대 교수, 상명여대 교수 등 한국수필학회 회장, ‘현대수필’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고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고문 등 저 서 수필문학론, 수필작품론, 현대수필작가론, 운정의 수필론 수필집 ‘구름카페’, ‘청바지와 나’, ‘어느 로맨티스트의 고백’, ‘바람은 떠남이다’, ‘윤재천 수필문학전집’(7권), ‘퓨전수필을 말하다’, ‘수필아포리즘’, ‘구름 위에 지은 집’ 등 수 상 한국수필문학상, 노산문학상, 한국문학상, 올해의 수필가상, 흑구문학상, PEN문학상, 조경희 문학상, 산귀래문학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