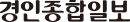[윤재천 수필 ㊹]
유달리 피곤한 귀가 길이 있다.
어느 날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고, 강의하고, 책을 보고…. 이제는 타성이 되어 벗어날 수 없는 궤도처럼 끈질긴 인력(引力)에 끌려 의식하지 못한 채 걸어온 세월이다. 별나게 피로할 것도 없고, 기뻐 흥분할 것도 없어진 이즈음의 생활이다.
가끔 친구들이 모여 박장대소함이 즐겁고, 제자의 방문을 받는 날이 흐뭇한 사건이 되고 만 지금이다. 여기에 좀 보탠다면 자식의 장성이 미덥고, 큰 탈 없이 자라주는 것이 고마울 뿐이다.
몇 그루씩 모아온 수목이 제법 마당을 좁히고, 한두 권씩 모아온 책이 서재를 비좁다고 하니, 이것이 살아가는 기쁨이요 여유다. 따라서 별나게 큰 황홀과 기쁨을 맛본 지 오래이니 그다지 큰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좋게 말하면 연륜의 안정이라 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일찍 주저앉혀진 안일에의 탐닉이라 할 수 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며 세월은 흘러간다. 이 세월이란 것이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 어지간한 일들을 해결해 주고 처방해 준다. 나는 못 이긴 척, 이 세월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하루쯤은 지독히 피곤과 권태가 밀려오는 저녁나절이 있다.
돌아오는 차 속, 피곤해진 육신을 간신히 내맡겨 버릴 때, 도회 고층 건물의 횡포 속에 하늘을 본 지 오래되고 제대로 숨쉬어 본 지 오래인 것 같은 질식할 듯한 착각 속에 빠져 버릴 때, 가까스로 빌딩을 비집고 먼지 낀 차창으로 쏟아지는 한 줌 햇살에 경이를 느끼게 된다.
이 고마운 한 줄기 햇살은 내 투박한 검정 외투 팔소매로부터 앞자락 누런 서류봉투를 거쳐 옆에 앉은 또 한 사람의 피곤한 시민의 여린 손끝을 지나 통로로 내려선다.
햇빛.
겨울 저녁 한 줄기 버스 창틈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외롭고 가느다란 햇살은 시야를 밝게 해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피곤에 흐려졌던 동공에 긴축감을 준다. 생생한 생명감을 준다. 한 줄기 햇살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자식과 나무와 같다.
이 햇살 덕택에 속눈썹 위에 올라앉아 있는 한 점의 먼지는 크게크게 확대되어 온다. 회색빛이기도 하고, 크림 빛이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바이올렛 빛이다.
자세히 보면 햇살의 칠색 무지개는 ‘살로메’의 일곱 가지 너울 같기도 하다. 여기에는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있고, 보고 싶은 얼굴이 그려져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고, 참회록을 집필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이고, 딸에게 글을 받아쓰게 하는 눈 먼 ‘밀턴’이 보인다. 나는 여기서 우주를 보며 만물을 본다. 섭리도 깨닫고 진리도 깨우친다.
한 점 먼지.
깊은 대로의 침잠이요, ‘정관(靜觀)의 세계(世界)’로 인도되어진다. 그 인도는 한 점 먼지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때때로 글로 옮겨 본다.
이것이 수필의 세계요, 한 편의 수필이 쓰여 지는 착상점이 되기도 한다.
어느 피곤한 귀가 길 차 속에서 숱한 만남을 하고, 숱한 깨달음에 빠지는 것이다.
혼탁한 도회의 차 속에서 발견되는 귀한 착상이 있고, 때로는 눈 내린 겨울 들판을 달리는 야간열차 속에서의 착상도 있으며, 밥상머리 아내의 시중에서 크나큰 소재를 얻는 경우도 있다.
내 수필의 의미는 고요에로의 침잠이다.
한 편의 수필이 쓰여 지기까지의 착상 발전은 여러 경우, 여러 모습을 띤다. 내가 수필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진지함에의 도달이다.
나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자 한다. 성실하게 살고자 원하며 항상 추구하는 자세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듭 반복되어지는 자신에의 목적을 명징(明澄)하는 방법의 하나로 나는 ‘수필’이란 형식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수필가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흔히 사회가 붙여주는 ‘○○가(家)’라는 괜한 인정을 원치 않는다.
수필을 쓰는 일은 내 자신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생리에서 오는 것이라면 너무 오만에 치우치는 것일까. 과연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쓰는 것이냐는 질문은 좀 더 나 자신에게 여유를 달라고 하고 싶을 뿐이다.
수필은 4차원의 세계다. 그것이 문제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바라는 ‘승화의 감정’, 그것을 더 사고 싶다.
허욕과 탐욕, 위선을 버리고 내가 나이고 싶은 소이(所以)에서 수필은 쓰여 지고 거두어진다.
인생.
그 오묘함, 그 거룩함, 그 위대함.
나는 낙천주의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염세주의자도 아니다. 내가 나이고 싶은 소이는 인생을 인생답게, 인생이란 것에 값을 주고 살자는 것이다.
한 편의 수필이 쓰여 지기까지 이런 생각과 과정을 거친다.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기사
- 어쨌든 인물
- 작가는 작품으로
- 인연의 늪
- 순결, 그 지순한 이름
- 봄은 수채화
- 머리는 좋은데
- 구름 위에 지은 집
-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접목
- 구름과 함께하는 나날들 (구름이 사는 카페)
- 수필이 명리학(命理學)을 만나다
-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 변화의 흐름에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
- 겨울의 서정
- 글의 참모습
- 수필의 길을 걸으며 - 나의 수필관(隨筆觀)
- 수필의 길을 걸으며 - 나의 수필관(隨筆觀)
- 수필의 길을 걸으며 - 나의 수필관(隨筆觀)
- 수필의 길을 걸으며 - 나의 수필관(隨筆觀)
- 여름
- 계절이 주는 의미
- 계절이 주는 의미 2
- 시련은 삶의 마디일 뿐
- 흥부와 놀부 사이
- 골방수필
- 사랑의 묘목
- 고정관념, 수사적 기법으로
- 정서와 사색의 다양성
- 산이 주는 힘
- 변신
- 단골집
- 달림을 멈추지 않기 위해